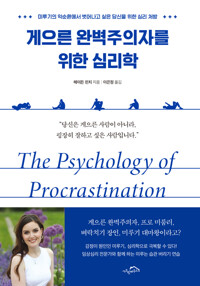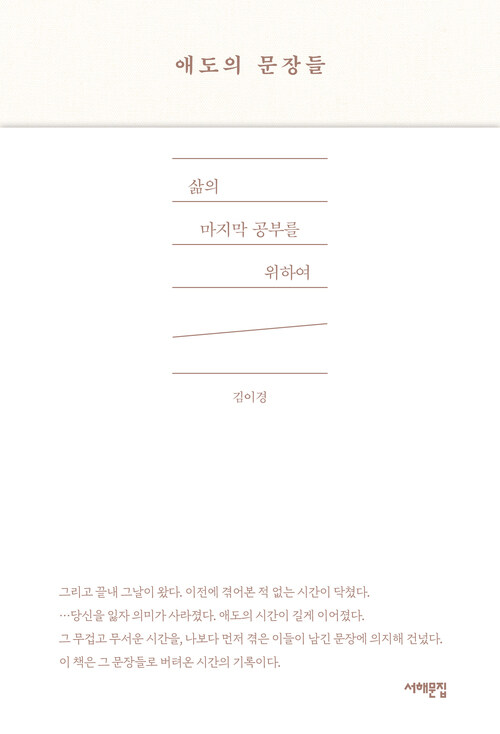

애도의 문장들삶의 마지막 공부를 위하여
김이경 지음사람은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육신의 숨이 끊어짐으로써, 또 한 번은 생전에 인연을 맺은 이들의 기억에서 소멸함으로써. 육신이 시드는 과정은 누구나 대동소이하지만, 기억으로서의 한 인간이 사라지는 양식은 저마다 다르다. 두 죽음 사이에서, 산 자들은 애도나 추모를 표함으로써 고인을 기린다. 애도와 추모는 다르다. 추모가 흔히 고인의 공적 행적을 비추는 데 견줘, 애도의 밑바닥에는 삿된 애틋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운 이를 향한 그리움, 안쓰러운 이에 대한 안쓰러움. 이 보편적이되 특별한 심상을 우리는 ‘애도’라고 부른다.
여기,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한 문장들이 있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죽음을 사유해온 철학자들이 남긴 단장들, 문인들의 시와 소설, 영화, 에세이와 신문기사에서 길어낸 글귀들이다. 각 챕터의 서두를 장식하는 이 문장들을 죽음에 관한 통찰로, 애도의 온도를 높이는 아포리즘의 실로 묶어내는 것은 저자의 ‘애도 일기’와 ‘마지막 공부’의 여정이다.
1부 <울다―애도일기>는 아버지이자 평생의 스승이었던 이를 향한 제망부가(祭亡父歌)’다. 동시에 지금도 애도의 시간을 견디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건네는 위로다. 2부 <배우다-마지막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한 배움과 궁리의 소산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에서 시작한 질문은 과학과 철학, 인간이라는 종(種)과 문화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죽음이 내뿜는 두려움의 근원을 파고들며 ‘죽음과의 화해’를 도모한다. 이 책은 병리학과 해부학 저편의 죽음을, 심리학과 사회학 너머의 애도를 이야기한다. 그럼으로써 언젠가 나에게도 우연히 다가올 이 필연에, 무기력한 순응이 아닌 자유의지로 감응하는 법을 넌지시 일깨운다.
여기,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한 문장들이 있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죽음을 사유해온 철학자들이 남긴 단장들, 문인들의 시와 소설, 영화, 에세이와 신문기사에서 길어낸 글귀들이다. 각 챕터의 서두를 장식하는 이 문장들을 죽음에 관한 통찰로, 애도의 온도를 높이는 아포리즘의 실로 묶어내는 것은 저자의 ‘애도 일기’와 ‘마지막 공부’의 여정이다.
1부 <울다―애도일기>는 아버지이자 평생의 스승이었던 이를 향한 제망부가(祭亡父歌)’다. 동시에 지금도 애도의 시간을 견디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건네는 위로다. 2부 <배우다-마지막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한 배움과 궁리의 소산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에서 시작한 질문은 과학과 철학, 인간이라는 종(種)과 문화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죽음이 내뿜는 두려움의 근원을 파고들며 ‘죽음과의 화해’를 도모한다. 이 책은 병리학과 해부학 저편의 죽음을, 심리학과 사회학 너머의 애도를 이야기한다. 그럼으로써 언젠가 나에게도 우연히 다가올 이 필연에, 무기력한 순응이 아닌 자유의지로 감응하는 법을 넌지시 일깨운다.
주제 분류